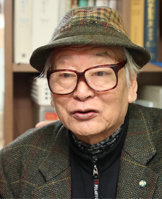내가 본 김병관

윤세영동SBS그룹 명예회장
나와 화정 김병관 회장의 인연은 1993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이 처음 생겼다. 어느 날 아침 고려대 출신인 SBS 우석호 보도본부장이 모교 고려대에 언론 최고위과정이 출범하여 1기생을 모집하는데, SBS 사장인 나를 꼭 1기생으로 모시고 싶다는 모교의 전갈을 전해 왔다. SBS 초창기라 언론 공부도 필요해 응낙했고 입학식에서 김병관 회장과 만났다. 그렇게 김병관 회장과의 인연이 시작됐다.1기생은 50명이 넘었는데, 쟁쟁한 분들이 참 많았다. 영화계만 놓고 보더라도 강수연, 강신성일, 신영균, 이태원, 임권택 씨 등이 있었다. 언론계와 관계, 경제계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분들이 많았다. 언론대학원에는 처음 생긴 최고위과정인 데다 화정이 열심히 권유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공부도 공부지만 최고위과정이라는 매력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했다. 화정도 거의 개근을 했다. 공부가 끝나고 맥주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눌 때도 많았다. 그런 자리에서 화정과 언론을 통한 사회 발전과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많다. 가장 자주 얘기를 나눴던 것은 역시 언론과 권력의 관계였다. 이 화두는 언론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실천하기란 만만치 않다. 화정은 언론 경영자로서 약간의 여운을 둘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런 뜻을 종종 피력했다. 나는 화정의 그런 견해를 새겨들었다. 일반 기업인으로 있다가 언론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신문 경영을 해온 화정의 언론관은 내게 좋은 공부가 됐다.
최고위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구룡회’라는 단체를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부부 동반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만날 정도로 모임은 활발했다. 초대 회장이 화정이었고, 그 다음을 내가 맡아 꽤 오랫동안 회장으로 일했다. 좋은 모임, 나가고 싶은 모임이었기때문이다.
이 모임에서 화정의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화정은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 출신’아닌가. 나야 자수성가한 축에 들고. 그런데 화정은 그런 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국내는 물론이고 함께 외국 여행도 자주 갔지만 언제 어디서건 늘 적당한 식당이나 숙소 등을 고집했다. 꾸며서 그렇게하는 것이 아니라 화정은 원래부터 검소한 사람이었다.
화정의 첫인상은 투박하다. 그런데 인정과 정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으면 육자배기나 타령을 할 정도로 흥이 있었다.
반면에 승부욕도 만만찮았다. 화정은 골프를 잘 치는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와 가끔 어울리는 경우‘딩동댕’이라는 게임만을 했는데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따는 경우가 제법 많았다. 나는 그게 신문 경영을 하며 터득한 승부근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정이 정국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발행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장이나 회장 때도 평기자보다 취재 욕심이 많았다는 말도 들었다. 그는 천생 신문인, 언론인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1990년 정부로부터 민영방송인 서울방송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TV보다 라디오를 먼저 개국하게 됐다. 그때 받은 라디오 주파수가 792MHz였다. 하루는 화정이 나를 보더니 “792채널 원래 동아방송 건데, 신군부가 빼앗아서 KBS에 준 것은 알고 있지”라고 물었다. 표정을 보니 농담만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때 서울방송에는 동아방송 출신 고위 간부들이 꽤 있어서 나중에 설명을 듣고, 동아방송에 대한 동아일보의 애착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다. 화정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동아방송을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집념 같은 것이 있었던 듯하다. 하기야 빼앗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화정과의 관계를 일이 아니라 삶의 여유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싶다. 내가 화정과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모두 환갑 즈음이었다. 죽마고우는 아니다. 자칫 이해관계로만 사귈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했다. 그런데 15년을 만나면서도 우리 둘은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물론 얼굴을 붉힌 적도 없다.
구룡회는 공식적인 식사나 골프 모임 외에도 화정의 가회동 집이나 다른 회원들의 집에 가서 편하게 노는 경우가 꽤 있었다. 우리는 그걸 ‘이사회’라고 불렀다. 그 모임이 왜 그렇게 즐거웠던 것일까. 우리는 각자 회사를 열심히 경영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회적 체면이나 주위의 시선 때문에 무엇인가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사회’는 서로 비슷한 나이에, 서로 이해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그 무엇을 슬그머니 채워줬다. 그렇다. 나는 그때 뜻이 맞는 친구들과 인생을 즐겼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화정이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아까운 분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살아계셨더라면 동아일보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더 많이 공헌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말로 화정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다. 뒤늦게 만난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그립다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