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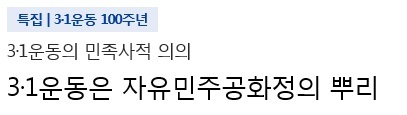
글 :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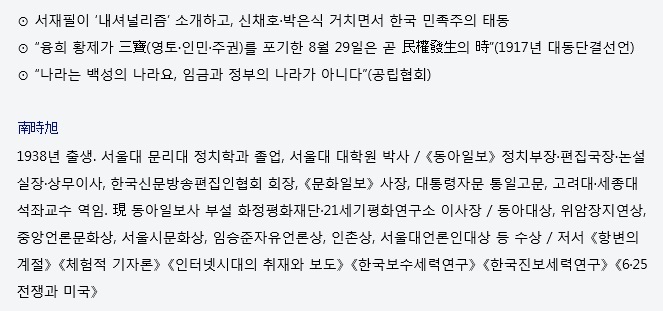

3·1운동 당시 “만세”를 외치며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 미국 선교사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으로 컬럼비아대학 유니언신학교 산하 버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3·1독립운동은 한국 민족주의의 거대한 폭발이자 공화정(共和政)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잉태라는 점에서 민족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민족주의는 서양에서는 18세기 말~19세기 전반기에 걸쳐 일어난 신성로마제국의 해체와 민족국가들의 탄생이 민주주의와 결합,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구현하면서 등장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이 그런 사례다. 영국의 경우는 이보다 빨리 17세기 말 명예혁명으로, 일본은 그보다 뒤늦은 19세기 후반에 메이지(明治)유신으로 근대적인 입헌군주제도를 채택했다. 이에 비해 한민족(韓民族)은 기미독립운동 이후 26년이 지난 다음 비로소 일제(日帝)로부터 해방되고, 이어 3년 후 공화정이 실현되면서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에 성공했다.
개화파와 한국 민족주의의 태동
한국의 민족주의는 조선조 말기부터 개화파(開化派)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국과의 불평등 관계 청산의 동력으로 내연(內燃)하고 있었다. 기원은 조선 왕국이 열심히 중국에 사대(事大)하던 18세기 후반 일부 실학파(實學派)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학의 거두인 성호 이익(星湖 李瀷)과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중화사상(中華思想)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했다. 이런 사고(思考)는 개화파에 계승되었다. 개화파의 시조인 박규수(朴珪壽)는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 등 개화파 청년들 앞에서 자신이 손수 만든 지구의(地球儀)를 돌려 보이면서 “오늘날 중국이 어디에 있는가? 저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고, 이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되는데 중국이 (따로)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당시 조선의 식자(識者)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서양의 국제공법 책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최초로 조선에 들어온 국제공법 서적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이다. 이 책은 베이징(北京)의 외국어학교인 동문관(同文館) 총교습(總敎習・교장)으로 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 P. Martin)이, 미국의 법률가이자 외교관인 휘턴(Henry Wheaton)의 책(《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836)을 번역해서 1864년에 간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국제법 서적이 당시 조선에 수입되어, 서양의 문명국가 사이 모든 국가는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청(淸)나라와 종주국(宗主國) 대(對) 조공국(朝貢國)의 불평등 관계가 해소된 것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인 1905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이 되고, 1910년에는 끝내 병합됨으로써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 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체코・유고슬라비아・폴란드 등 신생독립국이 생겨나고 헝가리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분리하게 되자, 일본 식민지인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큰 자극을 받았다. 우선 윌슨이 이듬해 소집한 파리평화회의(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할 대표를 파견키로 하고 이들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서울・도쿄(東京)・블라디보스토크에 밀사를 보내 시위를 벌이도록 함으로써 서울에서 대대적인 3・1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서재필, “조선 인민들, 독립이라 하는 것을 몰라”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소개한 서재필.
최남선(崔南善)이 기초한 3·1독립선언문에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무려 12군데나 나온다. 이 선언문은 ‘민족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 ‘민족자존의 정권’ ‘이민족(異民族) 겸제(箝制)의 통고(痛苦)’ ‘민족적 존영(尊榮)의 훼손’ ‘민족적 양심’ ‘민족적 독립’ ‘아(我) 문화민족’ ‘민족심리’ ‘민족적 요구’ ‘양(兩)민족’ ‘민족의 정당한 의사’ 등 11가지 표현을 썼다. ‘민족적 요구’라는 표현은 두 군데서 쓰였다.
그러면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도대체 언제 생겨났는가.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조선에서 최초로 쓴 사람은 서재필(徐載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한제국 당시인 1898년 최초로 ‘민족주의’를 언급했다. 다만 그는 ‘민족주의’를 한글로 쓰지 않고, 서양 선교사들이 발행하던 한국 최초의 영문 월간지 《Korean Repository(韓國彙報)》의 그해 11월호에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라는 영문(英文)으로 썼다. 그는 자신이 결성한 독립협회가 정치적 대화의 장(場)이 아닌, 교육기관(an Educational Institution)이라고 했다. 설립목적은 단결정신(the Spirit of Cohesion), 민족주의(Nationalism), 견해의 자유(Liberty of Views), 교육의 중요성(Importance of Education)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썼다.
이 시기 ‘민족주의’라는 한글 단어는 아직 《독립신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1896년 4월 7일부터 1899년 12월 4일까지 약 3년 반 동안 발간된 《독립신문》에는 ‘제국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민족’ 또는 ‘민족주의’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를 쓰면서도 ‘조선인민’ 또는 ‘조선신민(臣民)’이라는 용어만 사용했다. 창간 2개월이 조금 지난 1896년 6월20일자 《독립신문》 논설은 독립문 건립을 축하하면서 “조선 인민들이 독립이라 하는 것을 모르는 까닭에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업신여겨도 분한 줄을 모르고 조선 대군주 폐하께서 청국 임군에게 해마다 사신을 보내셔 책력을 타 오시며 공문에 청국 연호를 쓰고 조선 인민은 청국에 속한 사람들로 알면서도 몇백 년을 원수 갚을 생각은 아니 하고 속국인 체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서재필은 어떤 연유로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미국으로 망명해 1895년에 귀국한 서재필은 10여 년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공부하면서 당시 유럽대륙을 휩쓸던 민족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주장한 신채호.
한국에서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신채호(申采浩)와 박은식(朴殷植)이다. 신채호는 서재필이 ‘내셔널리즘’을 언급한 만 10년 뒤인 1908년 8월3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쓴 ‘홍수의 세계’라는 논설에서 ‘민족주의’를 다루었다. 그는 “민족주의의 사나운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개한 나라 인민은 빠져 죽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 동포여, 하늘빛이 어두웠는데 음침한 구름이 사면으로 모여 큰 바람이 불고 있으니 속히 노아의 배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때는 이미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2년 전이었다. 그는 이듬해에도 같은 신문 5월28일자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논설을 써서 “민족주의가 박약한 나라에는 제국주의가 침노(侵擄)한다”고 경고했다.
신채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청나라의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량치차오(梁啓超)였다. ‘민족’이라는 용어는 1903년에 출간된 그의 《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에 실린 〈민족론〉에서 나온다. 량치차오는 독일의 정치학자 블룬칠리(Johann C. Bluntschli)의 학설을 빌려, “왕왕 국민과 민족을 혼동하는 이가 있으나 이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다른 민족을 받아들여 동화시키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신채호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독사신론(讀史新論)〉의 서론에서 “국가의 역사는 민족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열서(閱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함으로써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삼았다.
박은식의 민족평등주의

민족평등주의를 강조한 박은식.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신채호의 민족주의론과 달리 박은식은, 제국주의의 강권주의(强權主義)를 비판하고 ‘민족평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세계대동(大同)・인류공존론’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한일합병 직후인 1911년에 쓴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라는 저술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경쟁과 살벌이 극렬해져 국가경쟁·종교경쟁·정치경쟁·민족경쟁이 행해진다”고 지적한 다음, 사회진화론적 인식을 부도불법(不道不法)이라 비판했다.
박은식의 민족평등주의 이론은 1917년 그 자신과 신규식(申圭植)·김규식(金奎植)·박용만(朴容萬)·신석우(申錫雨)·조소앙(趙素昻) 등 14명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으로 발전했다. 이 선언은 “독립 평등의 성권(聖權)을 주장하야 동화(同化)의 마력과 자치의 열근(劣根)을 방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언은 독립과 평등을 신성한 권리로 규정하고 일제의 동화정책과 조선인 일부의 자치론을 비판・봉쇄하려 했다.
3·1운동의 기본 이념도 민족평등주의이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민족자결주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지만, ‘인류 평등의 대의’를 강조하고 조선인의 독립선언은 “하늘의 명명(明命)이며 시대의 대세이고 전 인류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시점에서 평가해도 당시의 민족평등주의는 시대에 앞서는 쾌거라 할 것이다.
공화제 채택의 이론적 근거
3·1운동 이후 소련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上海), 그리고 한성(서울)에 3개의 임시정부(臨政・임정)가 설립되자 이들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벌어졌다. 논의 끝에 통합임정을 상하이에 두기로 하고 형식상으로는 상하이 임정이 서울 한성정부의 법통성(法統性)을 인정해 이를 봉대(奉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와 연해주에 설립된 임정은 해소하는 형식을 취했다. 말하자면 가장 법통성이 있는 서울의 한성정부가 상하이로 옮겨오는 모양새였다. 마침내 1919년 9월 11일 통합임정의 새 임시헌장(전문 및 8장 56조)이 제정되어 한민족의 단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탄생했다.
새로운 임시헌장은, 국체(國體)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한성정부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비록 임시정부일망정 현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政體)가 이때 도입된 것이다. 당시 임정이 복벽파(復辟派)의 왕정복고 주장을 물리치고 공화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이론화 작업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15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되고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둔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은 당초 왕정복고를 내세웠다. 신한혁명당은 이상설(李相卨)·신규식·박은식·유동열(柳東說)·성낙형 등이 참여한 조직이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의 호기가 왔다고 보고, 대한제국의 폐위된 황제를 중국에 망명시켜 그를 수반으로 하는 망명정부를 세운 다음 한중의방조약(韓中誼邦條約)을 체결해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전쟁을 벌이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규식은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공화주의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었지만,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복벽주의, 즉 왕정복고를 택했다. 그러나 신한혁명당의 계획은 고종의 탈출 실패로 수포가 되었다. 신규식 등은 동제사(同濟社)와 대동보국단을 중심으로 1917년 7월 공화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동단결선언을 채택했다.
대동단결선언은 “융희(隆熙) 황제가 삼보(三寶, 영토·인민·주권)를 포기한 8월 29일(1910년의 합병조약 발표일)은, 즉 오인동지(吾人同志)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저 제권소멸(帝權消滅)의 시(時)가 곧 민권발생(民權發生)의 시(時)요, 구한(舊韓) 최종의 일일(一日)은, 즉 신한(新韓) 최초의 일일(一日)”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국민들에 대한 묵시적 선위(禪位)이므로 국민들은 당연히 삼보를 계승해 통치할 특권(特權)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유주권론’, 혹은 ‘주권불멸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황제로부터 국민이 계승했다는 국민주권론의 이론화가 완성되었다. 이로써 1915년의 신한혁명당 등에서 주장하던 ‘보황주의(保皇主義)’는 완전히 끝장이 났다.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를 이끌었던 이준.
임정의 공화제 채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룩된 것이 아니다. 공화제에 관해서는 대한제국 멸망 이전부터 식자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 먼저 공화제 채택운동 이전에 이준(李儁)을 비롯한 일단의 애국지사들이 추진한 입헌군주제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05년 5월에 발족한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가 그 주체이다. 이준을 비롯한 구(舊)독립협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만든 단체인데, 명칭도 현대적인 감각을 주지만 설립목적 역시 국권(國權) 회복을 위해 입헌군주제도를 실현한다는 근대적 정치사상에서 비롯되었다.
헌정연구회는 설립취지서에서 “천하의 대세는 입헌”이라고 선언하고 “군민(君民)이 합의한 입헌제도는 문명의 열매이며, 국가는 국민으로 성립되고 군주는 국민으로 성립한다”고 밝혔다. 헌정연구회는 《헌정요의(憲政要義)》라는 책자를 만들어 일반에 보급하고, 《황성신문》에 그 내용을 연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헌정연구회는 헌법 문제보다는 국권수호 쪽으로 관심을 돌려 ‘대한자강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통감부의 압력이 컸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헌정연구회는 영국과 일본의 헌법을 ‘군주헌법’(입헌군주제)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높이 찬양하는 반면, 미국과 프랑스의 헌법을 ‘민주헌법’(공화제)이라 호칭하고 이를 ‘폭렬(暴烈)’하다고 경계한 점에서 용어 사용이나 발상에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 헌정연구회가 미국과 프랑스의 공화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이기는 하지만 황제가 엄연히 존재하던 당시 상황에서 입헌군주제를 최선의 제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박은식에 의하면, 당시 전권대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종 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폐하께서는 여러 신하의 말을 가벼이 들으셔 임금의 권한을 잃지 마십시오. 의원(議院)을 만들자는 근신(近臣)들의 요구는 임금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데서 나온 것이지, 충성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 결국 의회가 설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은 일찌감치 도입한 의회제도를 대한제국은 안 된다고 한 저의(底意)는 다른 데 있었다. 헌정연구회가 의회 설립을 주장한 배경에는 러일전쟁 후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에 의구심을 품고 입헌제도를 만들어 황제가 일제의 겁박을 받아 주권을 넘기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도 있었다.
한국에서의 공화제의 기원

공립협회를 이끈 안창호.
대한제국 말기에 공화제를 맨 먼저 주창한 독립운동단체는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安昌浩)가 설립한 공립협회(共立協會)였다. 당시 이승만(李承晩) 역시 미국과 프랑스식 공화제를 가장 좋은 정치제도라고 인정했으나, 백성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정치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무엇보다도 헌법만은 곧 제정해 입헌군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협회와 헌정연구회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입장에서 입헌군주제도를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다. 비록 나라는 이미 일본의 보호국으로 떨어지고 황제 역시 아무 실권(實權)도 없던 때였지만, 공화정을 위해 군주제를 폐지한다는 생각은 독립협회나 헌정연구회로서는 역모(逆謀)나 다름없었다.
이에 비해 안창호의 공립협회는 전제정치의 폐습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라를 되찾는 일은 근본적으로 전제정치를 변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협회는 “나라라 하는 것은 강토와 그 안에 있는 백성을 합하여 부르는 명사니, 나라는 백성의 나라요, 임금과 정부의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립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임금을 제거하고 새로운 국민정부를 세우는 ‘국민혁명’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립협회의 공화제 주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1919년 여러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채택하기 14년 전의 일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체와 정체의 원형(原型)이 공립협회라는 혁명적 해외운동단체에서 나온 것이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공립협회를 설립한 2년 후인 1907년에 국내에서 신민회(新民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신민회는 장정(규약)에서 “본회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관습을 혁신하여 국민을 새롭게 하며 이러한 국민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자유문명국을 세운다”고 정했다.
자유문명국이란, 바로 공화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해산하게 되자 두 파로 나뉜다. 이동휘(李東輝)를 대표로 하는 ‘무력투쟁파’와 안창호를 대표로 하는 ‘실력양성파’이다. 무력투쟁파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으로 망명하고, 실력양성파는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興士團) 활동을 벌인다. 국내에 남아 있던 세력은 그중 일부가 3・1운동의 주도세력이 된다.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역전
1919년의 3・1운동과 뒤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1세기 동안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영광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천만다행하게도 일본이 군국주의의 폭주로 태평양전쟁을 도발했다가 패하는 바람에 한국은 36년간의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벌인 빛나는 독립투쟁은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지지 않았더라면 당시에 우리가 과연 국권을 회복했을지 의문이다.
여하간 한국은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미소(美蘇) 양국에 분할 점령, 1948년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1950년 6・25전쟁 발발을 겪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재기해,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백성으로서는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계적으로 고속으로 이룩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체제와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열정이 이룩한 성공사례라 할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방어적·종족적 민족주의에서 탈피해 고도의 상호 의존적인 현대 국제사회에 걸맞은 글로벌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국토의 절반은 시대착오적인 공산왕조의 지배 아래 놓인 상황이며, 최근에는 북핵(北核)문제까지 겹쳐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 국면이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보수(保守)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으로 불리어 왔다. 김일성(金日成)조차 1945년 해방 공간에서 우익(右翼) 세력을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좌익(左翼) 세력을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이후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과 반미(反美)노선을 내걸고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면서부터 차츰 남과 북 간에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역전(逆轉)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정권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대대적인 선전공작을 벌이면서 기묘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제는 북한이 민족·통일 세력, 남한은 반민족·반통일 세력인 것처럼 왜곡하는 소리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당초 국제경기에서 남북단일팀을 나타내는 데 쓰이던 푸른색 한반도기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어느새 한민족의 ‘민족주의’와 ‘통일’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김일성민족 對 자유민주주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했기에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웠다. 그들은 민족주의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한 반동(反動)사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1950~60년대 중소(中蘇) 분쟁을 계기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족적 색채를 강조하다 나중에는 주체사상을 앞세운 특이한 민족주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1990년대 중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994년 10월 16일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회를 마친 뒤, 김정일(金正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후 ‘김일성헌법’으로 불리는 1998년의 북한 개정헌법 서문에는,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始祖)’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민은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에서 모든 국민이 ‘천황의 적자(赤子)’였듯이 ‘김일성 수령의 자손’이 된 것이다.
북한 공산왕조는 인민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정치범수용소에 12만명에 달하는 인민을 가둬두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의·인도·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3・1독립선언서가 천명한 한국 민족주의의 무도한 유린이다.
김일성민족주의자들과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이미 합의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식’ 행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각 우리가 직면한 시급하고 엄숙한 과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과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非核化)와 함께 참다운 3・1운동 정신을 한반도 전역에 구현하기 위한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적 신념 아래 북한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구현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처 : 월간조선 2019년 3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1903100031
